개발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땅덩어리가 비좁은 우리의 경우 개발논리가 상대적인 설득력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대신 그 자리에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들을 나란히 함께 세워 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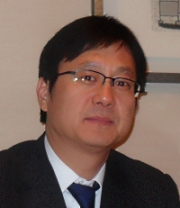
류영재 (주)서스틴베스트 대표스위스의 베비에르(Verbier)는 유럽인들이 최고의 휴양지중 하나로 꼽는 곳이다. 나는 몇 해 전 여름,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열리는 베비에르 뮤직페스티벌에 다녀왔다. 제네바공항에서 2시간 남짓 달렸을까. 눈앞에 거대한 알프스 산자락이 펼쳐질 무렵 우리가 탄 차는 급경사와 급커브의 청룡열차를 타는 듯 아찔한 주행을 하고 있었다. 흡사 이 길을 쭉 가다보면 하늘 초입까지 다다를 것 같은 느낌이었다. 신이 직접 빚어 놓은 곳이라는 유럽인들의 말이 허풍만은 아니었다.
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 나는 개인적인 용무로 거제도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서울을 갓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할 때만해도 내겐 아직 베비에르의 풍경과 모습이 잔영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어디쯤 다다랐을까. 그 잔영은 사라지고 내 눈엔 서서히 우리의 산하가 밀려 들어왔다. 도시와 도시 사이를 지날 때면 어디든 강이나 하천이 흐르고, 적당한 높이의 산이 조화되며 길은 높낮이를 달리하여 곡선의 유려함을 파노라마처럼 쏟아 냈다. 나는 우리의 경치에 취해 시차가 있었음에도 감히 졸 수 없었다.
그러한 감흥은 몸과 땅이 하나라는 신토불이(身土不二)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무리 냉정하게 봐도 우리의 산하는 아름다움 그 이상이다. 자연이 빚은 땅과 숲과 강의 모습만을 비교했을 때, 분명 우리의 산하는 스위스의 산하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산하 곳곳의 속살들이 허옇고 벌겋게 깎여지고 파여져 있다면, 스위스의 산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조화하며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즈음 나는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공공재의 문제'가 떠올랐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인류생태학 교수를 지낸 가렛 하딘(Garrett Hardin)은 1968년 '사이언스'지에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신선한 생각거리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 공공재 혹은 가렛이 말하는 공유지란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물, 공기, 삼림, 가로, 어족자원 등을 말한다. 가렛은 이러한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무한정 공짜로 공급될 것으로 여겨졌던 공공재들에게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부분의 환경오염은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출발한다. 개발과 성장의 논리에 묻혀, 자연환경이 무한정 우리 곁에 존재할 것만 같은 착각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도 자연환경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현재 세대인 우리들에게 달려 있기에 우리 세대의 필요를 채울 수만 있다면, 또 단기적 관점에서의 비용 편익분석을 거쳐 이익이 예상된다면, 그것을 파헤치고 깎아내도 무방하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이런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례가 있다. 노르웨이는 1969년 북해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한다. 그 유전은 1971년부터 노르웨이에 막대한 원유수입을 가져다주며, 국가재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원유생산의 초기부터 이들은 자연이 가져다준 경제적 축복을 70년대를 사는 노르웨이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이들과 그 다음 세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운다. 자연자원의 혜택은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몫이기도 하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철학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유전개발 수익금을 적립하여 그 대부분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보건복지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 현재의 노르웨이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 복지국가로 우뚝 서 있는 것은 40여 년 전 그들 선조들의 다음세대에 대한 친절한 배려와 긴 안목 때문일 것이다.
개발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땅덩어리가 비좁은 우리의 경우 개발논리가 상대적인 설득력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중첩적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연환경이나 사회적 가치들을 후순위로 내몰았던 우리들의 고단한 역사가 그 불가피성을 변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젠 그런 논리들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그 대신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들을 나란히 함께 세워 놓아야 한다. 환경의 훼손은 쉽사리 복원가능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무한한 자원도 결코 아니라는 가렛의 경고를 새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도 오늘날 스위스 베비에르 주민들이 향유하는 자연자원에 대한 자부심,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로 경제적 부수입도 함께 챙기게 해야 한다. 아무리 봐도, 우리의 산하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지금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는.
